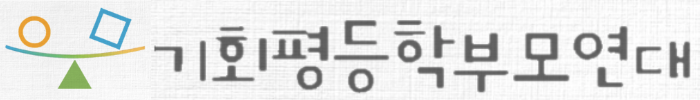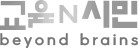구한말의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는 한양 중심 질서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 지역이었으나, 그 배제의 형태와 강도는 지역마다 달랐다. 조선 후기 문과 급제자 지역 비율을 보면 이러한 불균형이 뚜렷하다. 17세기 급제자 55%가 경상, 전라, 충청 3도 출신이었고, 경기, 한성까지 합치면 남부, 중부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평안도는 전체의 1.5~2%, 함경도는 1% 내외, 황해도는 3~4% 수준에 그쳤다. 이는 단순한 지역 편중이 아니라, 조선이 북방 삼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지표였다. 평안도(현 평안남북도)와 함경도(함경남북도)는 이러한 차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무과보다 문과를 중시하는 시대에서 문과 급제자 비중이 2%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제도적 장벽이 존재했다는 증거다. 병자호란 이후 국경 방어를 이유로 중앙은 평안도를 ‘불안정 지역’으로 분류했고, 실제 정승, 판서급 고위 관료 가운데 평안도 출신 비율은 조선 전체를 통틀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평안도 주요도시인 평양, 의주, 정주 등지의 상업 활동이 활발해 19세기 후반에는 조세 수취량 대비 시장 규모가 남부 지방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조사(평양의 시장 규모는 1870년대 기준, 전국 도시 중 3위권)도 있다. 현대와 달리 농업,공업,상인 계급이라는 신분차별로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국가재정의 중요 요인인 세금납부를 책임지는 상인들을 철저히 배제함을 의미한다. 요즘, 정치권에서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부자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대한민국과 동일하다. 황해도는 중앙과 가깝지만 권력 중심에 편입되지 못한 지역이었다. 황해도는 대규모 곡창지대가 아니었고, 평양, 원산처럼 국제 교류의 큰 창구도 없었다. 경제 규모가 중간 정도였던 만큼 정치적 영향력도 중간에 머물렀다. 조선 후기 교육 기관 통계를 보면, 황해도의 서원, 향교 수는 전국 평균 대비 약 60~70% 수준으로 낮았다. 이런 조건 속에서 황해도는 평안도의 강한 자존심도, 함경도의 국가안보적 생리(애국심)도 공유하지 못하며 실용과 조율 중심의 지역 기질을 형성했다. 함경도는 북방 삼도 중 가장 강한 배제를 겪었다. 문과 급제자 비율이 1% 이하로 가장 낮았고, 중앙 벼슬길은 사실상 닫혀 있었다. 조선 후기 군사, 세금·농업 통계를 보면, 함경도는 인구 대비 조세 수취량이 남부의 절반 이하였고(특히 함흥부 길주목은 전국 대비 30~40% 수준), 국가적 투자도 극히 적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여진, 만주와 맞닿아 있었기에 군사력과 생존력이 강한 사회 구조를 가졌고, 구한말 이후 연해주,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 중 30% 이상이 함경도 출신이었다는 러시아, 만주 관문 기록이 남아 있다. 이런 이주 패턴은 함경도의 현실적, 개척적 성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세 지역은 모두 차별을 받았지만, 상호 인식은 한 덩어리가 아니었다. 평안도는 상업 규모와 신문물 수용 속도에서 우위를 점하며 자신들이 “억눌린 능력자”라는 자의식을 가졌고, 이는 함경도의 군사적, 폐쇄적 기질이나 황해도의 조율적 성향과 뚜렷한 대비를 이루었다. 황해도는 자신들이 ‘중심과 주변의 경계선’에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평안도의 대외적 자존심과 함경도의 강경한 생리 사이에서 독자적 태도를 형성했다. 함경도는 평안도를 “서울과 가까운 성향을 가진 지역”, 황해도를 “중간만 하는 지역”으로 보면서, 자신들이 처한 냉혹한 국경 현실과 다른 세계로 인식했다. 이러한 알력은 현대적 의미의 지역감정보다는 경제 기반, 교육 인프라, 군사 환경, 관료 진출 구조가 만든 문화적 거리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개화기 신교육 수용률에서 평안도는 선교학교, 근대식 학당 설립 수가 1890~1910년 사이 전국 대비 15% 이상을 차지했고, 함경도는 해외 이민 비율은 압도적이었다.(주로 중국 만주와 러시아 지역) 반면 황해도는 대규모 개화 운동이나 해외 이주에서 두드러지지 않고, 농업 기반 유지와 지역 내부 경제에 머무는 경향이 컸다.
 뉴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공급업체에 부과하는 식재료관리비 ... "제도개선하겠다"
뉴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공급업체에 부과하는 식재료관리비 ... "제도개선하겠다"
 뉴스
‘2025 서울 국제바칼로레아(IB) 콘퍼런스’ 개최
뉴스
‘2025 서울 국제바칼로레아(IB) 콘퍼런스’ 개최
 이슈
작년 조리종사원 파업으로 학교급식 중단 학교 전체의 31.5%
이슈
작년 조리종사원 파업으로 학교급식 중단 학교 전체의 31.5%